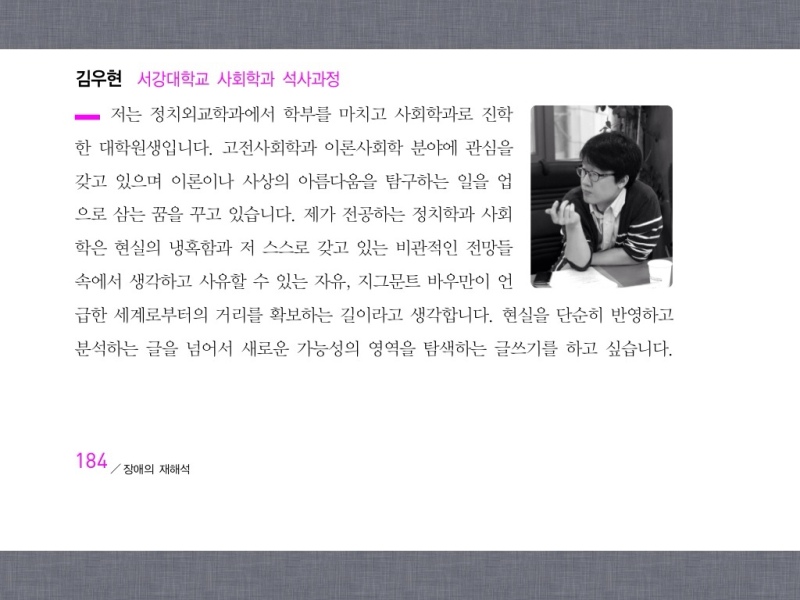사실 요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. 막 마음에 안 들고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요조의 노래는 너무 기능적이었기 때문이다. 마음이 우울하거나 그냥 알콩달콩한 노래 듣고 싶을 때 딱, 요조의 노래는 딱 거기까지였다.
그러므로 이 "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" 앨범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제목인 "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 였더라"를 본 후 나는 내심 이 앨범도 그냥 귀염귀염하게 부르는 노래겠지, 뭐 끽해야 일상적이고 친근한 감성을 일깨우기 위한 작업이겠지, 이렇게 생각하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. 올 가을까지만 해도 요조는 내게 딱 그 정도였다.
그러나 트위터에서 이 노래, "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"를 접하고 나는 충격에 빠졌다. 아니, 요조에게 이런 노래가 있다니. 사운드도 꽤나 괜찮고 말이지. 아니, 이상순? ..그 이상순 말인가? 요조는 싫어하겠지만 나는 자연스레 옛 연인 이상순과 요조의 연애를 떠올리게 되었고, 그렇게 나는 (내가 받아들이고 싶은대로) 이 앨범을 이해하게 되었다.
음, 이 노래는 두 대의 어쿠스틱 기타와 남과 여의 목소리가 있고, 그것들의 조화가 있고, 조화를 가능케하는 마법같은 감정이 있다.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. 아니 나는 음과 가사 저편에 있는 그 감정들과 기억들만 생각한다.
'세상 > 들어보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마누엘 드 빠야, jota (0) | 2013.05.02 |
|---|---|
| Franck violin sonata, 4악장 (0) | 2013.04.29 |
| 무소르그스키, 전람회의 그림 (0) | 2010.09.15 |
| La Valse, 근대와의 작별 (0) | 2010.09.10 |
| 비발디, 사계. (2) | 2010.04.01 |